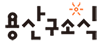봄나들이, 그리고 용산의 버스터미널

자! 그럼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가는 곳은 벚꽃놀이가 한창인 진해이고, 출발지는 서울, 지금은 1970년대이다. 1970년대이니 당연히 자가용은 없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간 다음 거기서 진해까지 어찌어찌 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 편한 방법은 서울에서 진해까지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야 한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기억조차 못하지만,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용산에 있었다. 한강로3가 65번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이 들어선 자리가 1970, 80년대에는 버스터미널이었다.
‘용산’하면 옛날부터 교통이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용산은 교통의 요지였다. 그때는 용산 교통의 중심이 지금 청파동에 있던 청파역이었다. 고려시대에 수도 개경(지금 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모두 청파역을 거쳐 지금 한남대교 자리의 사평나루에서 한강을 건넜다. 하지만 근대 들어 철도가 개통되면서는 달라졌다. 1900년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14년 경원선이 차례로 완공되면서 전국을 X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간선철도망이 구축되었는데, 그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용산역이었다.(이 이야기는 <용산 횡설수설> 제9편에 나온 다.) 철도가 놓이면서 한강에서 서울역(당시는 남대문역)까지 가는 새 도로가 만들어졌다. 철도와 평행하게 가는 지금의 한강로가 그것이다. 이렇게 새로 만든 길을 이름 그대로 신작로(新作路)라고 불렀다. 1917년에 한강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길은 경성에서 목포, 부산, 인천으로 가는 간선도로의 중심이 되었다.

도로가 닦였으니, 이제는 차만 있으면 여행을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총독부가 신작로를 낸 것은 여행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특히 용산의 신작로는 여기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군사적 필요를 우선 고려한 것이었다. 차도 없었다. 1912년에 한국에 여객 자동차, 즉 버스는 대구에 단 한 대가 있을 뿐이었다. 1926년에는 여객자동차 업자가 250명으로 늘었지만 1931년에 전쟁이 시작되고부터는 연료 사용이 통제되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광복 이전 전국에 자동차가 5,000대 정도 있었고, 경성에는 겨우 200대 정도가 있었다. 경성의 시내 교통은 전차가 중심이었고, 시외 교통은 기차가 중심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그 점에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6.25 전쟁이 끝난 뒤 1955년 서울의 인구는 157만 명, 등록된 자동차 수는 6,435대였다. 이 해에 생산되기 시작한 시발(始發)자동차는 그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불과 60년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 되리란 것을 그때 꿈엔들 알았을까.) 서울의 자동차 수는 1970년 12만 대, 1990년 120만 대, 1995년 200만 대, 2014년 300만 대로 늘었다. 자동차의 폭증과 더불어 197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가 정비되어 자동차 여행의 시대가 열렸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시외버스도 늘어났고, 그러자 서울시에서는 도심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을 모두 외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1967년의 일이다. 그에 따라 용산의 남부 터미널과 불광동(사실은 대조동)의 서부 터미널, 용두동의 동마장 터미널 등이 만들어졌다.
용산의 남부 터미널은 1967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1968년 12월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완성했다. 이 터미널은 한강 남쪽으로 오가는 시외버스들이 이용했고, 이밖에 서부 터미널은 일산·파주·문산 방향, 동마장 터미널은 의정부·춘천·광주·이천 방향으로 다니는 버스가 이용해서 행선지별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중 용산의 터미널은 용산역 바로 앞에 있었고 서울역과도 가까웠을 뿐 아니라 한강로를 오가는 시내버스도 많아서 접근성이 좋았다. 그런데 이곳이 서울의 외곽, 즉 변두리여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왔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용산의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버스터미널은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다. 하루 500대가 넘는 버스가 오가면서 주변 교통이 늘 막혔고, 버스들이 소음과 공해를 유발해서 점차 도심 부적격 시설로 분류되었다. 결국 1980년대 중반부터 용산의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마침 서울의 지하철이 개통되었으므로 이전할 터미널 자리는 지하철과 연결되는 곳에서 찾게 되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 부지가 물망에 올랐지만, 당산동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 불편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진척되지 못하다가 서초동에 있던 화물터미널을 양재동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1990년 7월 이전이 완료되었다. 지금의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그곳이다. 이로써 1967년부터 1990년까지 용산 버스터미널의 25년 조금 안 되는 역사가 끝이 났다. 비슷한 시기에 동마장 버스터미널은 상봉 시외버스터미널과 동서울 종합터미널로 이전했고,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은 일산·파주·문산이 서울 시내교통권으로 편입되면서 이용객이 감소하자 문을 닫았다.
봄이 참 짧다. 이 글을 쓸 때와 이 글이 나올 때가 벌써 계절이 다르다. 그래서 ‘봄날은 가아안다~’가 아니라 ‘봄날은 간.다!’ 올해는 이미 늦었다면 내년에라도 봄꽃을 감상하는 나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