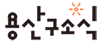용산의 한글박물관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용산에 가 볼 곳이 있다. 한글박물관이다.

한글박물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을 지우면 더 박물관답지 않을까?
한글은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한국의 문화 가운데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한글 또는 훈민정음이라고 답한다. 더 나아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도 얘기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문자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구상에는 수천 가지의 언어가 있고, 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130개가 넘는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문자는 30여 개에 불과하니, 많은 언어가 자기를 표현할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셈이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문자가 없으니 우리말을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서 표기했고, 그 때문에 문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직접 지은 서문 첫머리에서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이다. 따라서 한글은 우리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문자일 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는 할 수 없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자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나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알파벳이 가장 적합한 문자일 것이다. 한글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이 최고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한글의 우수성은 감춰지지 않는다. 우선, 한글은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다. 아주 옛날부터 문자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어 왔고, 중국의 한자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둘째, 한글은 이전에 없던 독창적인 문자이다. 한글 이전에 동아시아에는 한자를 비롯해서 거란문자, 서하문자, 여진문자, 몽골문자, 일본의 가나 등이 있었지만, 한글은 이런 문자들을 모방하지 않고 발음 기관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다. 셋째, 한글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밝혀져 있다. 자음은 ㄱ, ㄴ, ㅁ, ㅅ, ㅇ 다섯 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고(예를 들어, ㄴ을 확장하면 ㄷ, ㄸ, ㅌ이 되고, ㅁ을 확장하면 ㅂ, ㅃ, ㅍ이 된다) 모음은 기본이 되는 ㆍ, ㅡ, ㅣ 세 개를 조합해서 수십 가지로 확장했으며,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는 할 수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 한글의 위력
한글의 진가는 만든 지 500년이 지나서 더욱 빛이 났다. 근대 이후 동양의 여러 문자 가운데 서양어의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기에 가장 쉬운 문자가 한글이었다. ‘유럽’을 예로 들어보자. 영어의 Europe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歐羅巴’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대략 [오울루오바], 일본에서는 [요오롯빠] 정도로 읽는다. 한글이 원어에 가장 가깝다. 그럼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떻게 할까? 중국어는 ‘澳大利亞’라고 쓰고 [오달리아] 쯤으로 읽고, 일본어 발음은 [오오스토라리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복잡하니 뚝 잘라서 ‘濠洲(호주)’라고 쓰고 [하오저우](중국), [고오슈우](일본)라고 읽는다. 이런 것이 어디 한두 개일까? 한 가지 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편리한 문자다. 한글은 세계에서 핸드폰 문자판의 수가 가장 적은 문자다. 이것은 다섯 개의 자음과 세 개의 모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한글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쯤 되면,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을까?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이 왜 우수하다고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2014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부터 창제 과정과 글자의 원리, 그리고 이후 한글 사용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한글이 자랑스럽다면, 왜 자랑스러운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박물관이 그런 공부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다만, 한글에 대한 친절한 설명 외에도 세계의 다른 문자와 비교해서 한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보여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글날 유감
곧 한글날이 돌아온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방송에서는 번화가의 간판을 보여 주며 우리말을 놔두고 외국어 이름을 쓰는 풍조를 걱정한다.(특히 아파트 이름이 그렇다. 시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긴 외국어 이름을 짓는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어려운 외국어를 한글로 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세종대왕이 바라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그 발음에 가깝게 쓸 수 있어서다. 그러나 외국어 남용이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아예 외국어 단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일이 많아졌다. 모든 국민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것 말고도 세종대왕께 죄송한 일이 있다. 한글로 유럽,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중국, 일본을 따라서 구라파, 불란서, 호주같이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이다. 달러를 ‘불(弗)’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말이 살아야 한글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는 “(매우)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썼으면 될 일이다.
한글박물관을 품에 안고 있는 용산구에 살고 있다면 우리말을 좀 더 잘 쓰려고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예쁜 꽃을 보면 [꼬시 예쁘다]라고 하지 말고 [꼬치 예쁘다]라고 하고, 무릎이 아프면 꼭 [무르피 아프다]라고 말하고, 형편이 좋아져 빚을 갚았을 때도 [비슬 가팠다]가 아니라 [비즐 가팠다]라고 하면서 우리말을 지켰으면 좋겠다.